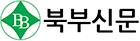편집국 bukbu3000@naver.com
어머나! 이럴 수가!! 꽃이 없어졌다. 꺾인 게 아니고 누군가 뿌리 채 뽑아갔다.
가게 앞 가로수 옆에 조그맣게 화단이 있어 철맞이 예쁜 꽃을 심어 놓고 아침저녁 물주는 재미, 보는 즐거움, 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뿌듯함, 세 가지를 충족시켰던 꽃을 밤새 누군가 뽑아간 거였다.
아침마다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달맞이꽃부터 저녁때면 그 자태를 한층 뽐내는 코스모스까지 몽땅 도리를 당해 텅 빈 꽃밭을 보며 내 머리도 텅 비었다.
누굴까. 도대체 누가 나와 손님들과의 눈 건강과 얘깃거리를 송두리째 앗아간 걸까. 그 옛날 애지중지 간직했던 반지 고리를 이사하며 잃어버렸을 때와 비슷한 감정이었다. 며칠 동안 그 서운함과 괘씸함으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. CCTV를 달까도 생각했었는데 돈도 돈이지만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싶어 달지 않은 게 못내 후회가 됐다.
몇 날이 지났을까. 수심에 찬 내 얼굴을 보다 못했는지 선애가 얘기했다.
“언니! 얼마나 예쁘면 그걸 뽑아갔겠어! 없어진 꽃은 누군가의 손에서 잘 크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새 식구를 들이면 되지 응? 언니”
참, 선애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우리 식당일을 돕는 천사 같은 아이다.
‘아,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었지 왜 그 생각을 진즉 못했을까. 없어진 꽃은 나에겐 참 괘씸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손에서 어쩌면 더 예쁘게 클 수도 있을 텐데, 더 큰 사랑을 받을지도 모르는데’
꽃집엘 갔다. 가을 국화가 각기 다른 웃음으로 우릴 반기고 있었다. 한 움큼씩 골라서 가게 앞 화단을 다시 꾸몄다.
‘이제부턴 내가 니들 엄마니까 더 이쁘게 커야한다’
꽃잎에 코를 맡 대고 나즉이 말했다. 그리고 하트모양으로 글씨도 한줄 남겼다.
<난 그냥 여기가 좋아요 여기 있게 해 주세요>
보내는 것과 맞이하는 것,
또 다른 배움으로 하루를 접는다.
Since 1992 아씨보쌈 대표